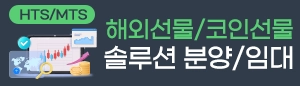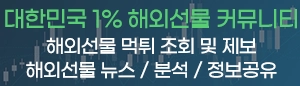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주부 탈선 )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그녀 - 중편
 라이브맨
단편야설
0
627
0
03.18 18:38
라이브맨
단편야설
0
627
0
03.18 18:38

"예. 그럼 조금 있다가 봬요."
아. 일단 만날 약속은 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다.
그냥 동네서 마주쳤을 때 작업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거짓말한 게 바로 들통날 것이고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까지 설명해야 할 노릇이다.
도무지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나가지 말아버릴까? 전화가 계속 올 테지만 안 받으면 될 거고. 대략 성향 파악은 됐으니 다른 전화기로 새롭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다시 작업한다고 해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어차피 그녀는 나를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쇠뿔도 단김에 빼자.
일단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그녀가 날 몰라볼 테니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비해 두는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이미 경계심이 풀린 상태다. 게다가 오늘 낯선 남자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10분쯤 늦게 커피빈으로 갔다. 그녀는 창가 쪽에 앉아있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약간 원숙해 보이는 외모임에도 옷차림은 20대들처럼 짧은 스커트에 다리를 꼰 채로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막 전화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어차피 그녀는 나를 모른다. 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노민경 씨죠?"
"네. 통화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알아보겠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예. 통 기억에 없는 얼굴이시네요?."
"하하. 제가 그렇게 늙어버렸나요? 하하. 이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둘러 왔는데 주차할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하하. 일단 밖으로 나갈까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순순히 따라 나왔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이 근처에 괜찮은 횟집 새로 생겼던데. 회 괜찮으시죠?"
"네..근데..잘 모르는 얼굴이신데. 어떻게 아는 분이셨죠?"
"하하. 일단 가서 말씀하시죠."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돌아갈 자세는 아니었다.
일식집 다다미방의 폐쇄적인 구조가 더욱 그녀를 호기심이 생기도록 만들었을까? 그녀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전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못 본 얼굴이신데?"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이건 뭐 좀 궁색하기는 한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따로 특정해서 뭐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라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기억해낼 텐데 그러면 더 난감해질 수도 있었다.
"일단 좀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횟감도 싱싱하니까..한잔 괜찮으시죠?"
역시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우지 않고 있었지만, 건배도 하면서 술은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첫 잔을 비우고도 잔을 부딪칠 때마다 반 잔씩은 비우고 있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모르는 분하고 술을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정체도 모르는데."
"뭐 차근차근 알아나가면 되죠. 스무고개라도 해야 하나요? 하하..."
몇 잔 술이 들어가면서 그녀의 볼도 발그스레 지고 있었다.
술과 함께 경계심도 조금씩 풀렸던 걸까? 화제는 나이로도 옮겨갔다가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
그녀는 주말부부였다. 일찍 결혼해서 큰애는 벌써 중학생이었고 신랑은 실직한 후로 지방의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오갔지만 1~2년 지나면서 2주에 한 번도 다녀가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봤죠? 인제 정체를 좀 밝혀보시죠? 아니 좀 밝혀보지. 내가 누나니까. 흥.."
그녀는 나보다 3살 많았고 37이었다.
"하하..글쎄..전에 나이트에서 부킹했든 거 아니었을까요? 요기 한국관이었던 거 같은데. 하하"
"그랬나. 그게 언제였지?"
"자주 오시나 봐요? 하하.."
"뭐. 내가 가나. 친구들 때문에 가는 거지. 난 뭐 춤 같은 건 그렇고.."
"그럼 부킹하러?"
"이보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계속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술은 잘 마시는 것 같았다. 횟감도 좋았고 덕분에 술도 적당히 나눠마실 수 있었다.
"술을 잘 드시네요. 많이 드시나 봐요?"
"뭐 현장에서나 일 끝나고 많이 마시죠. 요즘은 통 일감이 없어서..."
"아. 즐기시는데 요즘은 자주 안 드시나 봐요?"
"그러게..."
"그럼 식사도 다 했고. 자리 옮겨서 맥주라도 좀 드실래요?"
"맥주는 배불러서. 매운탕까지 먹어서 소화도 안 된 거 같은데."
"그럼 어디 노래방 가서 노래나 좀 부르시던가."
2차까지 가겠다니 일단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인가?
그녀는 아직 확실히 경계를 풀지는 않고 있었다. 계산하려고 나오면서 보니 여전히 꼿꼿이 걷는 데다가 발음도 또렷했다.
"자기 차는 어떻게 하려고?"
"어...어..뭐 대리 부르지 뭐..일단 노래방 가야지?
"어..좀 피곤하네. 애들도 혼자 있고.."
뭐야 적당히 먹고 가려는 건가?
"왜요. 벌써 가려고? 다 컸다면서요? 꼭 가봐야 되면 가고요."
"그럼 잠깐만. 여기 노래방 있네. 먼저 들어가 있어. 전화 좀 하구 올라갈께."
"그래요.그럼 올라가 있을게요..."
이거 바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일단 노래방에 들어가서 일행 오면 계산한다고 하고 6번 방으로 들어갔다.
맥주로 입가심을 하면서 오늘 바로 공략해야 하나? 한다면 어느 모텔로 가야 하나?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 닭 쫓다 지붕만 쳐다보는 거 아닌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행히 그녀가 곧 들어왔다.
"오래는 못 있겠다. 좀 취하는 거 같기도 하고. 많이 안 마셨는데..피곤했나 봐.."
"그래요. 좀만 부르다 가죠..뭐..."
최신곡 한 곡씩을 부르고 난 뒤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나름 흥이 돋궈진 상태였던지라 슬쩍 손을 내밀면서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귀엽게 박자를 맞추던 그녀는 싫지 않은 척 블루스 자세로 안겼다.
2~3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홍조 띤 볼과 불룩한 가슴에 육봉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간헐적으로 그녀의 뜨거운 콧김이 느껴졌다.
한 손으론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어깨춤에 있던 다른 손을 허리께로 내렸다가 서서히 가슴 쪽으로 옮겨갔다.
그녀가 손을 살짝 잡더니 다시 허리춤으로 올렸다.
"이그..늑대.."
싫지 않은 앙탈이었다. 둥글게 스텝을 밟았지만, 불룩 튀어나온 육봉이 살짝씩 그녀의 몸에 스쳤다.
몸을 움찔거리면서 피했지만, 적극적으로 피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보너스 시간까지 대략 50여 분을 그렇게 소극적인 탐색으로 보낸 후에 노래방을 나왔다.
"어떻게..? 좀만 더 있다가 가요.. "
"뭐 술 한 잔 더하려고? 들어가야지."
"집이 어디쯤인데요? 아니면 근처 가서 한 잔 더 하던가.?"
"난 여기서 금방인데..**몇 단지.."
"앗..나도 거긴데.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
"그래? 어딘데?"
"일단 갑시다. 차 두고 택시를 타고 가면 되니까. 가까운데 살고 있었네."
------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