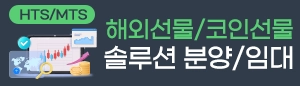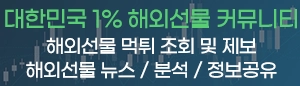너무나도 잊을수 없는 그녀 하편
 토토군
야설
0
176
0
10.29 18:00
토토군
야설
0
176
0
10.29 18:00
너무나도 잊을수 없는 그녀 하편
둘째날 밤은 그렇게 헤어졌다.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동료들 눈치도 있고 하니 오늘은 얌전히 들어가 자는 것이 옳다며 지수가 엘레베이터를 타버렸다. 다음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니 오늘은 쉬어야 한다는 핑계도 덧붙이고.
아쉬웠다. 하지만 천사같은 지수와 지낸 이틀이 꿈만 같았다. 또 이곳에 사는 여자 같았으면 이틀을 그렇게 보내고 두번이나 질펀한 섹스를 즐겼다면 남자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느껴야 하고 뒷감당(?)도 간단히나마 해줘야 할텐데, 바로 내일이면 한국으로 가버리니 부담도 없고 마음도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지수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 거렸다. 165cm 정도 되는 알맞게 큰 키. 길고 날씬하게 뻗은 다리. 길고 흰 손가락. 보드라운 손. 동그랗고 유달리 빛나는 눈동자. 오똑하게 솟은 코. 정말이지 부드럽고 맛있는 입술. 적당히 열기가 느껴지는 혀. 길고 가는 목. 군살 하나 없이 남자 마음 녹이고도 남게 생긴 잘록한 허리. 귀엽게 파여 있는 배꼽. 딱 내 한손에 잡혀 들어오는 유방. 우유를 부어 놓은듯 하얗고 눈부신 유방의 피부. 어린 소녀와 아줌마의 유두 딱 중간 사이즈인 유두 사이즈. 진한 갈색의 유두.
첫날밤. 동료가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나눴던 섹스가 떠올랐다. 그녀는 오르가즘을 느꼈다. 삐져 나오는 신음 소리를 참느라 베게 속에 얼굴을 파묻고 엔조이하던 그녀의 뒷모습. 나를 향해 치켜 올려 있던 엉덩이를 부르르 떨며 베게를 있는 힘을 다해 얼굴에 묻던 그녀의 모습. 흔들거리던 그녀의 잘록한 허리. 엎드린채 내 거시기를 안에 넣은채 중력의 힘을 못 이겨 아래로 살짝 늘어져 흔들리던 그녀의 유방. 오르가즘을 느끼던 때, 나의 허벅지 뒤로 꼬아 나를 당기던 그녀의 앙증맞은 두 발.
둘째날. 내가 아침마다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 으슥한 곳. 차 안에서 느꼈던 그녀의 상체. 정말 보드랍던 그녀의 살갗. 도톰하게 살이 붙은 그녀의 입술.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깊은 호수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던 그녀의 두 눈.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죽치고 앉아 있는 사무실.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녀의 벌거벗은 상채. 삼면이 통유리인 내 사무실의 오전은 가슴이 탁 트일만큼 환하고 시원하다. 그런 분위기에서 보았던 그녀의 벌거벗은 상채. 그 어디에서 보았던 여자의 알몸 보다도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레돈도비취 어느 한적한 동네 한켠. 차 안에서 즐겼던 그녀와의 섹스. suv인 덕분에 내 차 안에서의 섹스는 비교적 편했다. 나의 발과도 같은 이 차. 늘 운전하며 오른팔을 올려놓는 팔받이. 이 팔받이에 그녀의 음모와 아랫배가 올려져 있었을 것. 내가 늘 엉덩이를 대고 있는 운전석 의자에 얼굴을 파묻은채 내 거시기를 받아주던 그녀의 모습. 흥분을 하며 비비 꼬이는 몸을 가누지 못해 손을 뒤로 뻗어 운전대를 부여잡던 그녀의 모습.
꿈만 같았던 그녀와의 시간이 내일이면 끝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녀. 마지막날은 동료들과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암튼 전화를 하겠다며 엘레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 엘레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귀엽디 귀여운 미소를 지어보이며 내게 손을 흔들어 주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이런 그녀를 생각하며 어둠 속에 눈을 감고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거시기는 다시 발딱 서 있었다. 순간 충전기에 꽂혀져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있던 내 핸드폰이 띠릭띠릭 벨 소리를 울렸다.
"여보세요."
"기현씨. 자요?"
"아, 아뇨. 이제 막 자려구요."
지수였다.
"어제,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그 인사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아쉽네요. 내일 가신다니까..."
"네. 저도 아쉬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음 LA에 언제 오는지 알게 되니까 바로 연락 드릴게요."
"내일 공항에 몇시에 가세요? 제가 공항에 가도 될까요?"
"내일 일정 보고 전화드릴게요. 공항에 오셔도 오래는 못뵐거에요."
"네. 꼭 전화하세요. 어서 들어가서 주무시구요."
"네. 기현씨도 잘 자요."
"지수씨도 잘 자요."
아쉬운 전화 통화였다. 전화를 끊고서 이 여자가 아무리 늦었지만 마지막 밤이 아쉬워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더 보자고 전화를 했던 것인지, 정말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전화를 한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견디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딸딸이를 한번 치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콧노래를 부르며 시작한 하루. 이날따라 바이어들과의 대화도 순조로웠고 오랜기간 공들였던 주문도 성사되는등 이래저래 기분이 좋았다. 업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사장님, 점심 식사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하고 묻는 통에 시계를 보았더니 어느덧 12시 15분이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요? 저는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서들 식사하고 오세요."
나는 책상에 앉아 지수의 전화를 기다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어디니?"
"응. 나? 나 회사지."
"그래? 지수씨는 갔니?"
"응. 조금 전 통화했는데, 공항으로 간다고."
"응. 그래?"
"너한테는 전화 안 했어?"
"응. 나한테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아쉽고 허전했다. 하지만 그날 퇴근 시간까지도 그녀는 연락이 없었다. 한국에 도착했을 시간인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와의 짧고 달콤했던 시간은 끝이 났다. 그녀가 왜 내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왜 다시 볼 것을 거부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녀와의 이런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고 그로부터 몇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와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잠 못 이루고 외로움에 허덕이는 밤이면 아직도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딸딸이를 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