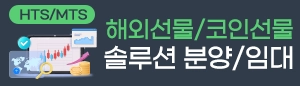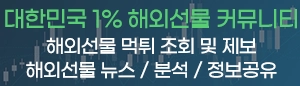욕망의 포효 20
 토토군
장편야설
0
565
0
03.18 13:31
토토군
장편야설
0
565
0
03.18 13:31

“난 아직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어. 8년 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날 잡는 당신 손을 너무 차갑게 뿌리쳤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 한구석에 안고 살았다는 사실만 알아줘.
사과하고 당신에게 다가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미안해.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 당신 가슴 깊이 새겨진 아픔이 지워질 수 있도록 말이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걸 희수도, 진선도 느꼈다. 설마 진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사과할 줄 몰랐던 희수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랐다.
모욕당한 것 같은 진선은 효준을 노려보다가 효준의 책상으로 가서 책상 위의 것들을 쓸어버렸다. 책상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당신 미쳤어?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았다고? 배경만 보고 결혼했다고? 진심이야?”
“진심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몸을 일으킨 효준은 진선 앞에 서서 말했다.
“죽여 버리겠어! 저 여자 내가 죽여 버리고 말 거야.”
진선이 희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효준이 막아서며 진선을 저지했다.
“이거 봐! 비켜! 가만두지 않겠어! 난 당신 사랑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인 양 말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저 여자에게 무릎을 꿇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죽어버려! 가만두지 않겠어!”
진선이 몸부림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두 팔을 휘두르던 진선은 효준의 얼굴을 치면서 그를 확 밀쳤다.
“윽.”
뒤로 밀린 효준은 짧은소리를 내며 얼굴을 한 손으로 감쌌다.
“효준 씨. 괜찮아?”
희수가 효준에게 다가왔다.
“괘, 괜찮아.”
희수는 효준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손을 뗐다.
오른쪽 눈꼬리에서부터 귓불 근처까지 손톱자국이 선명하게 나면서 피가 솟았다.
희수는 급히 구급함을 꺼내 붕대를 길게 잘라 연고를 짰다.
소독약으로 피를 닦아내고는 붕대를 상처 난 부위에 갖다 대고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는 멍한 얼굴로 보고 있던 진선의 뺨을 거세게 쳤다.
느닷없이 맞은 진선이 휘청거리며 책상에 부딪혔다.
“무, 무슨 짓이야?”
“이 얼굴에 당신 손톱자국이 남으면 당신 얼굴에도 똑같은 자국이 남을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안 둬! 효준 씨, 병원 가자.”
희수가 효준을 데리고 대표실을 나왔다. 효준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걸 보니 눈이 뒤집혔다.
진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효준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소진선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프지?”
“걱정돼?”
“아무 말 하지 마.”
“희수야.”
“그냥 나한테 덤벼들게 놔두지. 내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남으면 어쩔 거야?”
“남자 얼굴인데 뭐 어때.”
주차장으로 온 희수는 효준을 보조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다.
“다른 상처도 아니고, 소진선이 남긴 상처를 그대로 남기려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내 살을 뜯어서라도 그 상처 덮을 거니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는 희수의 말투와 표정이 너무도 단호하고 진지해서 효준은 말을 잇지 않았다.
걱정시킨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점을 떼어준다고 하니 감동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그는 상처를 누르고 있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희수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눈물을 닦고 액셀을 밟았다.
***
“상처가 남을까요?”
희사가 드레싱을 하는 옆에 서 있던 희수가 초조한 듯 물었다.
“피는 좀 많이 났지만, 상처가 깊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에. 다행이다.”
희수가 말하자 효준이 눈으로 웃었다.
“응.”
정말로 상처가 남으면 어쩌나 희수는 크게 걱정했다. 남자 얼굴이어도 상처를 남게 할 순 없었다.
특히 소진선이 남긴 상처는 더더욱 안 되었다. 그나마 상처가 남지 않을 거라고 하니 다행이었다. 한숨 놓은 희수는 효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 됐습니다. 모레 다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병원에 와야 할까요?”
희수가 물었다.
“두 번 정도 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방전 드릴 테니 약 타서 드시고요.”
“네.”
희수는 효준의 팔을 잡고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와서 차에 타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치료하고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상처는 볼 수 없었다.
“상처는 깊지 않다고 해도 두 번은 더 와야 하나 보네. 아파?”
“조금. 희수야?”
“응.”
“나, 환자다.”
“뭐?”
“혼자 있고 싶지 않아. 환자를 혼자 두지 않을 거지?”
“약한 척 어리광 부리지 마.”
“나, 배고파.”
“점점?”
“라면 먹고 싶어. 강희수표 라면. 김치 잔뜩 넣은 라면.”
그의 어리광에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전처 앞에서 옛 여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이 없었다고 해도 전처가 아니었는가.
그냥 전처인가. 크나큰 상처를 준 전처가 아닌가.
어쩌면 자신이 입은 상처보다 그가 입은 상처가 더 아플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무릎을 꿇은 그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코끝이 찡했다.
그의 사과는 당연하다. 받아야 할 사과를 받은 것인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희수가 어떤 마음인지 효준은 알고도 남았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만, 사과 받는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진선 보란 듯이 무릎을 꿇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사실 진선 보라고 한 것도 맞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희수라는 사실을 진선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다.
그 사실을 인지했기에 진선이 그 난리를 쳤을 것이다. 효준은 휴대폰을 꺼내 다이얼을 눌렀다.
[네, 대표님. 좀 어떻습니까?]
성 실장이 전화를 받았다.
“괜찮아. 대표실 정리 좀 부탁하지. 오늘은 안 들어갈 거야.”
[알겠습니다.]
“강희수 씨도 안 들어가.”
[네.]
효준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당신도 휴대폰 전원 꺼.”
효준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