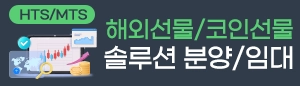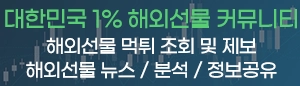욕망의 포효 23
 토토군
장편야설
0
596
0
03.18 13:32
토토군
장편야설
0
596
0
03.18 13:32

“뭐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요.”
“희수도 올 텐데, 냄새나 풍기고 있을 건가? 씻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두라고요.”
“난 희수가 자네 때문에 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내 여자야! 내 여자가 왜 자네 때문에 울어야 해? 절대로 그 꼴은 못 보니까 가만히 있어. 자꾸 이러면 침대에 묶어버리는 수가 있어.”
효준의 으름장에 휘석은 죽일 듯이 그를 노려보기만 했다.
지금 당장은 힘으로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지만, 윤효준의 도움을 받다니 수치스러웠다.
희수가 그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아서 더 윤효준이 싫었다.
윤효준이 어떤 놈인데 희수가 흔들리고, 받아들인단 말인가.
친구로서 희수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꼴도 보기 싫은데 마치 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더 꼴불견이었다.
기력만 좀 더 있으면 바락바락 대들어보겠는데 기운도 없어서 그럴 수 없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희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 왔어.”
“왔어?”
효준이 희수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휘석이는 좀 어때?”
“애가 따로 없다.”
“응?”
“어리광이 장난이 아니야. 가라고 떼를 쓴다.”
휘석이 효준이를 쏘아보자 희수가 씩 웃었다.
“왜 웃어?”
“너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서.”
“뭐?”
“뭐가?”
효준과 휘석이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신도 얼굴 다쳤을 때 환자라며 아프다고 어리광 부렸잖아. 휘석이하고 뭐가 달라?”
“난 쫓아내려고 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휘석아, 좀 어때?”
휘석은 효준의 얼굴을 봤다. 얼굴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했다. 다만 물으면 관심을 보인다고 할까봐 묻지 않았다.
“괜찮아. 침대 좀 올려줘.”
“그래.”
“내가 할게.”
효준이 리모컨으로 침대를 올려 휘석이 앉게끔 해주었다.
“이런 거 나한테 해달라고 해. 희수한테 그러지 말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거든.”
“내가 더 잘해.”
효준도 애 같았다. 질투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참. 성 실장님이 전화해 달래.”
“그래? 전화 좀 하고 올게.”
“응.”
효준이 휴대폰을 들고 병실을 나갔다. 희수는 휘석을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다.
“왜 이래?”
“많이 아프지?”
“괜찮아.”
“잘못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따라 왜 이래? 뭐가 고마워?”
“나, 밖에서 효준 씨가 하는 말 들었어.”
“그래서 감동했어? 그런데 얼굴은 왜 저런 거야?”
“전 부인이 나한테 달려들려는 거 막다가 그 여자 손톱에 할퀴었어. 피가 많이 나서 걱정했는데 상처가 깊지 않대. 병원 다녔고, 이젠 집에서 소독하고 테이프만 바꿔주면 돼.”
“그 여자가 너한테 덤볐어?”
휘석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효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희수가 당할 이유가 없었다.
“효준 씨가 그 여자 앞에서 내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거든.”
“무릎을 꿇었다고?”
“으응. 넌 아직도 그렇게 효준 씨가 싫어?”
“머리 아파. 다리도 아프고. 누가 좋고 싫고 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네가 좋으면 되지, 내 감정이 무슨 소용이야.”
“나, 저 사람 받아들이지 않았어. 용서하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될 거야. 8년 전의 일 따위는 잊고 말이야.”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도 좋아했으면 좋겠어.”
휘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몸도 성치 않아서 만사가 짜증인데 윤효준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희수가 못마땅했다.
“이상한 말 하지 마. 저 사람 좀 데리고 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
“너, 혼자 어쩌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돼. 내가 안심이 안 돼. 효준 씨라도 여기 있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어.”
휘석은 길게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굳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효준의 사과도 이해되지 않았다.
매몰차게 희수를 버리고 배경을 찾아 떠난 인간이 희수를 지켜줘서 고맙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결국 윤효준은 제 아내에게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두 여자의 인생을 희롱한 거나 다름없는 윤효준에게 흔들린 희수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만 가.”
“휘석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한테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처럼 왜 그래?”
“마음의 빚 맞잖아.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난 없어.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넌 나한테 소중한 친구야.”
휘석은 희수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응시하던 휘석은 계속 하늘을 보며 입을 열었다.
“윤효준 데리고 가.”
“안 된다니까.”
“좀 쉬게 하고 보내. 두 주일 동안 힘들었을 거야.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나도 혼자 있고 싶어. 서너 시간 쉬게 하고 보내라고.”
“괜찮겠어?”
“괜찮아.”
그때 효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효준 씨.”
“희수야. 청음에서 신메뉴 품평회를 열거야.”
“응?”
“상금도 걸 거고. 당신도 해볼래?”
“그런 말 없었잖아? 비서라고 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말 안 해? 성 실장님하고 의논한 거야?”
품평회가 열린다는 것보다 자신이 비서라면서 비서 취급을 해주지 않은 효준에게 서운한 희수가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희수야.”
“그걸 왜 비서한테 말해야 하는데?”
휘석이 끼어들었다.
“휘석아.”
“비서가 대표를 보조하는 사람이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윤효준 씨, 희수한테 아주 절절맸나 봅니다. 비서 주제에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