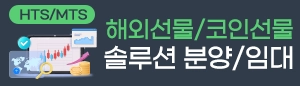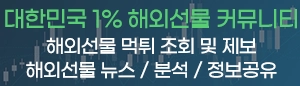욕망의 포효 30
 토토군
장편야설
0
672
0
03.19 21:20
토토군
장편야설
0
672
0
03.19 21:20

“청음에서 일하고 있지.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하고 있어.”
“비서 관두고요?”
“비서는 내가 희수를 내 곁에 두려고 일부러 끌어다 놓은 거고.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야지.”
“희수와 잘 해결된 모양입니다?”
휘석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없었다.
단지 궁금해서 묻는 것만 같았다.
효준은 휘석과도 잘 지내고 싶었다.
희수를 잘 보살펴준 고마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제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다.
휘석을 동생 삼아 지내고 싶었다.
“잘 됐어. 결혼도 할 거야. 내가 두 여자 인생에 흠집을 낸 나쁜 놈 같지?”
“같지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잖습니까.”
“후후후. 그래. 그렇지. 그런데 나도 아픔이 커. 철부지 때 선택 한 번 잘못해서 내 아이까지 잃고,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막연하게 아는 거와는 다르지.”
“아이를 잃었어요?”
“내가 무심한 놈이었거든. 임신한 아내,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혼한 겁니까?”
“서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서로를 보면서 자책하면서도 미워하면서 살았을 거야.
그 삶은 또 얼마나 고통이겠어.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거지.”
“재결합을 원한다고 들었는데요.”
효준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휘석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 효준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휘석을 응시했다.
“잘 정리했어. 그 사람도 재결합에 대한 마음 접었어. 나도 더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희수 덕분이지.”
“희수 덕분?”
“난 나만 희생자라고 생각했어. 전처가 모두 잘못한 거라고 여겼어.
그런데 희수가 그러더군. 아기 잃고 마음 편할 엄마가 어디 있냐고.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자책이 심할 거라고.
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 희수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는 걸 알았어.”
“희수가 그런 애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이에요.”
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자네는 왜 그래?”
“무슨 말입니까?”
“왜 나한테 친절하냐고.”
“친절이요? 제가 친절했다고요?”
“목소리에서 적대감도 없어졌고,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운데?”
휘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효준이 그렇게 느낀 것이 무안했다.
“앞으로 희수를 안 보고 지낼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어차피 희수 인생인데요. 또 희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것이 보입니다. 다시는 희수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네는 마치 희수 오빠 같아.”
“전생에 내가 희수한테 진 빚이 있었나 보죠.”
“희수를 한 번도 여자로 느껴본 적은 없어?”
“없는데요.”
휘석이 바로 대답하자 효준은 웃었다. 가만히 보면 휘석도 참 순수한 청년이었다.
“왜 웃습니까?”
“내가 자네라면 나 애먹이기 위해서 없어도 있었다고 했을 것 같거든. 희수 예쁘지 않아? 어떻게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휘석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와 며칠 같이 있는 동안 어머니가 오해를 했다.
희수를 짝사랑하는 줄 안 거다.
어머니가 슬쩍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었더니 효준에게 쌀쌀맞게 구는 것이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보통 다른 남자 같았으면 아니, 자신이 효준이었다면 보살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 같았다.
8년 만에 나타난 그는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
희수를 잘 보살펴주어 고맙다고 말하는 그에게 화도 났지만 어이도 없었다.
어머니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대충 설명했다.
어머니는 도와주겠다고 나선 효준이 고맙다고 했다.
자신이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다.
효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희수가 끌리고 있으니 말이다.
효준이 잘못하고, 괴롭히는 거라면 희수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다.
희수가 마음을 열고 대하는 효준이라면 자신이 미워할 필요가 없었다.
“희수의 마음을 열었잖습니까. 희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멀리했겠죠.
내가 윤효준 씨였다면 교통사고 났다고 돌봐주겠다며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아니. 자네가 나였다 해도 나처럼 했을 거야. 자네는 자네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네는 그런 사람이야.”
“날 잘 아는 척하지 말죠.”
“윤효준 씨가 뭐야?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내가 형님 맞잖아.”
“꿈도 꾸지 마시죠.”
“어머니는 희수네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터미널까지 모셔다드릴게. 하나뿐인 아들이 입원해 있으면서 걱정시키는 것도 불효인데 어머니 힘들게까지 해야겠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시끄러워요. 무슨 남자가 잔소리가 그리 심해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어?”
갑자기 말을 돌리는 효준을 보며 휘석은 인상을 썼다. 대화의 주제를 잡을 수가 없었다. 윤효준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에게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없어요. 어머니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희수는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걸 알기에 어쩌면 이성의 눈을 제가 접었던 걸지도 몰라요.
희수가 윤효준 씨를 기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결혼한 남자를 기다려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는 윤효준 씨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수에게 남자의 마음을 품었다면 친구로서도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마음을 접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반지, 커플링입니까?”
“응? 아! 으응. 희수가 준 거야.”
“희수가 줬다고요?”
“응.”
효준은 씩 웃었다.
왜 희수가 샀냐고 따지는 듯한 휘석의 눈빛이 재미있었다.
희수를 끔찍이 아끼면서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 참 다행한 일이었다.
휘석이 마음먹고 희수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딱 봐도 휘석은 우직하고 의리 있는 성격이었다.
이런 멋진 남자가 마음먹고 덤비는데 어떤 여자가 넘어가지 않을까.
“윤효준 씨 말고 형님이라고 하라고.”
“웃기지 말라니까요.”
“말 안 들어?”
“말 들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강희수 친구 아니랄까 봐 사람 애먹인다니까.”
효준은 밉쌀 맞은 휘석을 보며 콧등을 찡그렸다.
하긴 형님이라 부르라고 한다고 바로 형님이라고 부를 휘석이 아니었다.
멋쩍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할 테니 말이다.
언젠가 완벽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형님으로 불러 줄 날이 오길 기대하는 효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에필로그
주방에서 음식 데코레이션을 하는 희수는 집중하고 있었다.
주방 식구들이 힐끗거리면서 쑤군거리는 걸 의식하지 못했다.
주방으로 왔을 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희수가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으니 자기들끼리 수군댈 뿐이었다.
“다 됐습니다.”
옆에 서 있던 웨이트리스가 접시를 들고 나갔다. 허리가 아파서 쭉 펴던 희수는 힐끗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마주쳤다.
“왜 그러세요?”
“아, 아니야.”
“말씀하세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잖아.”
“아! 뭐가 궁금하신데요?”
“왜 비서직에서 잘린 거야?”
“원래 제 일이 이거잖아요.”
“그럼 왜 비서로 일한 건데?”
“대표님이 하라니까 한 거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그럼 그 반지는 뭐야? 대표님도 같은 거 끼고 있는 것 같던데.”
희수는 무심하게 반지를 쳐다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다.
“커플링이에요.”
“뭐, 뭐라고?”
“커플링?”
주방 식구들이 놀라 되물었지만, 희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대표님한테 홀딱 반해서 청혼했거든요.”
“뭐, 뭐, 뭐어?”
“대표님이 받아주셨어요.”
“저, 정말이야? 장난하지 말고.”
“커플링 맞다니까요. 대표님께 확인해보세요.”
희수가 농담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주방 식구들은 너무나 잘 알았다.
농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믿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대표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희수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다.
“강 셰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