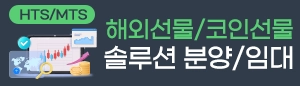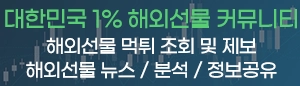욕망의 포효 34
 토토군
장편야설
0
894
0
03.21 01:20
토토군
장편야설
0
894
0
03.21 01:20

“야! 넌 네가 잘난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한신그룹 외동딸? 그래서 넌 그렇게 재수 없게 구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게 너야.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고 보는 넌 환자라고. 누구나 너한테 접근하는 것 같아? 네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것 같냐고. 찌질이? 안 쪽팔리냐고? 그러는 넌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듣냐? 니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잘난 건 네가 아니라 네 부모지. 운 좋게 있는 집에서 태어났을 뿐, 니가 뭐 그렇게 잘났어? 너야 말로 쪽팔린 줄 알아.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넌 정신병자야. 그래. 너 한신그룹 외동딸이라고 해서 좀 더 가지고 놀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너 같은 애하고 10분이라도 더 있느니 차라리 도우미 아가씨하고 몇 시간을 더 노는 게 낫지. 여자 같은 매력도 없는 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만 떠들고 그 팔 놓으시지.”
듣다가 기가 찬 휘석이 서윤의 옆으로 가서 섰다. 어이가 없는 건지, 충격 받아서 할 말을 못 하는 건지 서윤이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다.
“당신 뭐야?”
“이 손 치우라고.”
휘석은 서윤의 팔을 잡은 남자의 손을 쳐냈다.
“이 자식이! 너 뭐야?”
“당신은 뭔데 멀쩡한 여자한테 막말이야?”
“멀쩡한 여자? 얘가 멀쩡한 여자라고?”
“만나는 여자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쳐다본 당신보다는 훨씬 멀쩡하지. 운 좋게 좋은 부모 만난 것도 서윤 씨 능력이지. 헤어져 놓고 서윤 씨 조건을 알았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들러붙는 당신이 찌질한 건 사실이고.”
“이 자식이!”
화가 난 남자가 주먹을 날리려 하자 휘석은 가볍게 팔을 잡아 그를 밀쳤다. 그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임서윤 씨!”
“네?”
“정신 좀 차리시죠? 여기 이대로 있을 겁니까?”
“아니요. 그만 가죠.”
“야! 어딜 가? 거기 안 서?”
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봤다.
“재수 없는 나한테 더 당해볼래? 애들한테 웃음거리 만들어줘? 네가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달라붙었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 더럽게 치사해서 더는 너 안 본다, 안 봐. 어디 잘난 척하면서 살아봐라. 평생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 네 모습 지켜봐 줄 테니까.”
악담한 그가 커피전문점을 나갔다. 한숨을 내쉰 서윤이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잠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앞에 앉아있는 휘석을 쳐다봤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바람 쐬러 왔어요.”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사귀던 사람입니까?”
“네. 저 인간 말이 맞아요. 내가 한신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만나는 남자들에게는 숨겼어요.”
“조건만 볼까 봐?”
“네. 한신그룹 일원이었던 사촌 언니가 결혼할 남자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언니가 한신그룹 일원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남자였는데 언닌 그 사실을 모른 체 사랑에 빠진 거죠. 결혼 일주일 전에 그 남자와 동거하던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 일로 집안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서윤의 마음도 이해가 된 휘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좋아해서 만났을 텐데, 상대에게 솔직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 거다.
“왜 한신그룹에서 일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물론 좋은 집에서 태어나 편하게 살았고, 지금도 그러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아버지와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센스는 별로던데.”
“뭐라고요? 2차전 하자는 거예요? 그쪽 솜씨도 그리 뛰어나진 않거든요.”
“처음 드는 말입니다.”
“나도 센스 없다는 말 처음 듣거든요.”
“아닐 거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정의의 용사처럼 자기편이 되어주어서 조금은 다르게 봤는데 또다시 시비를 거는 휘석이 얄미웠다. 서윤은 그를 노려봤다.
“나갑시다.”
“어디를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는 서윤은 휘석을 따라나섰다.
“차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비 와서 택시 타고 움직였어요.”
“잘됐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휘석은 서윤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서연은 비가 내리는 바깥만 응시했다.
휘석이 어디로 차를 모는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밖만 내다봤다.
침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윤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다.
문자를 확인한 서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웬 한숨입니까?”
“친구들 모임에 나오라는 문자에요.”
“아까 그 친구도 참석하는 모임입니까?”
“네.”
“나가요.”
“싫어요. 그 인간 보기도 싫고, 친구들 만날 기분도 아니에요.”
“도망치는 겁니까?”
“도망이요?”
“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본 모양입니다.”
“이보세요. 왜 자꾸 신경을 건드려요? 내가 장휘석 씨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서 그대로 말한 겁니다.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으면 그 모임에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갈 수도 있죠.”
“그 친구 때문이잖아요. 보기 싫다, 기분이 아니다 하는 건 그저 핑계일 뿐이죠. 그 친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으면 오히려 나가야죠. 임 팀장님이 안 나가면 그 친구가 뭐라고 떠들지 뻔하잖아요.”
휘석의 말이 옳았다.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인간이 뭐라고 없는 소리를 지껄여 소문을 퍼뜨릴지 모를 일이었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수 없이 나가서 그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전환 좀 더 해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없어요?”
“없어요. 이대로 달리는 것도 좋아요.”
“알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휘석은 서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같은 남자지만, 아까 그 인간은 최악이었다.
아무리 여자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런 악담까지 퍼붓는 그가 꼴불견이었다.
이 마음의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왠지 임서윤의 콧대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윤의 기분이 전염된 걸까? 휘석이 기분도 썩 좋지만은 않았다.
***
“무슨 일이에요? 급히 오라고 해서 놀랐어요.”
서윤은 <청음>으로 희수를 만나러 왔다. 희수가 좀 보고 싶다며 부른 것이다.
“오늘이 친구들 모임이라면서요?”
“네? 그런데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나하고도 친하면서 어떻게 청음에서는 모임을 한 번 안 해요?”
“아! 그렇게 되나요?”
“이리 와 봐요.”
희수는 서윤을 룸으로 데리고 왔다. 테이블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본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희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서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빨리 친구들한테 오늘 모임은 여기서 한다고 연락해요.”
“네? 왜요?”
“이 자리 휘석이가 계획한 거예요. 이미 계산은 됐고, 음식 재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장휘석 씨가요?”
“네. 임 팀장님한테 막말한 것이 미안하대요. 그래서 그 사과의 뜻으로 준비한 거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무슨 사과를 이렇게 거하게 해요. 계산된 거 제가 돌려드릴게요.”
“안 되겠는데요.”
“네?”
“휘석이가 임 팀장님한테 도로 돈 받으면 다시는 내 작품 사진 안 찍어 준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강 셰프님…….”
“어서 친구들한테 연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