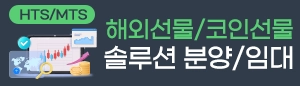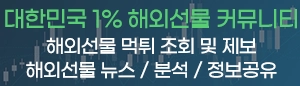오빠의 노예 - 22
 토토군
장편야설
0
691
0
03.31 01:10
토토군
장편야설
0
691
0
03.31 01:10

“아기는 축복받고 태어나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수단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던 냅킨을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나도 알아.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나는 비록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내 아이까지 내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왜…….”
“난 엄마의 생명과 맞바꾸고 태어난 존재예요. 축복일 수가 없죠. 아버지는 1년 동안 날 외할머니한테 맡겨 놓고 외면했어요.
물론 난 기억은 못 해요. 열두 살 때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친척들한테 들어서 알았거든요.”
당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기억을 떠올리고 있던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영아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잡고 내려놓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상처를 달래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오롯이 씻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 그렇다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릴 수도 없고, 부친이 외면했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그가 사랑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의 눈동자 가득 드러난 고독한 영혼을 알아보고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끌렸는지 모른다.
“그래, 우리 아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의식이 존재하는 나이부터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본능이 되었는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제물로 삼으려고 했다니! 자신이 끔찍했다.
사랑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질도 한참 부족한 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녀가 필요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를 놓치기 싫었다. 모자라니까, 그녀로 인해 채워지고 싶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다시는 실수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녀의 따뜻한 눈길에 그의 마음이 잔잔해졌다.
“나한테 너무 너그럽게 굴면 곤란한데.”
“왜요?”
“버릇 망치니까. 내가 그랬잖아. 난 너무 이기적인 놈이라고.”
그녀가 싱그럽게 웃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나요.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행복이 우선이니까. 우리 수영이나 할까요?”
“안 돼.”
“왜요?”
그가 이유를 말하기 전에 벌떡 일어난 그녀가 비틀거렸다. 그는 얼른 다가와서 그녀를 안아 올렸다.
“봐, 취했잖아.”
그녀가 눈을 끔벅이며 그를 몽롱한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오빠 팔은 요람 같아요.”
“넌 너무 가벼워. 더 마른 것 같아.”
“식욕을 잃었거든요. 오빠가 곁에 없어서.”
그녀가 한숨을 쉬며 그의 품 안에 바짝 안겼다. 작고 여려서 정말 아기 같았다. 그가 평생 지켜 줘야 할 여자였다.
그녀를 꼭 닮은 딸을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 한때 꿀 수도 없는 꿈을 꿔서도 안 되는 꿈이 현실처럼 아른거렸다.
“운동이라도 하지 그랬어. 근육이라도 키워야지 안 되겠어.”
그도 식욕을 잃었지만 대신 운동으로 근육을 키웠다. 그래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운동을 싫어했다. 수영도 그가 가르쳤는데 꾀를 부려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잠 온다.”
그녀의 눈이 감기자 그는 2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눕혔다. 아무래도 푹 재워야 할 것 같았다. 밤새 사랑을 나누느라 거의 잠을 못 잤으니까.
그가 연약한 그녀를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후회되었다.
이기적인 놈, 배려심이라고는 없는 놈.
그는 영아를 향한 끊임없는 욕정을 제어할 길이 없어 한심스러웠다.
아무리 그녀가 채근해도 그가 더 어른이니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는 그녀만 생각하면 짐승이 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몸을 식히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수영장에 머물렀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선베드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나 보다.
물을 튕기는 차가움에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영아가 그가 사준 하얀색 비키니를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즉시 후회했다. 그녀를 자극하려고 비키니를 사주는 게 아니었다. 처음에 영아가 고른 얌전한 원피스 수영복을 샀어야 했다.
겨우 식혔던 그의 욕망이 다시 불이 붙어 버렸다. 그의 물건이 검은색 수영복이 작게 느껴질 만큼 탱탱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걸 그녀도 봤고, 그도 느꼈다.
“오빠도 내가 필요해 보이네요. 나도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잔뜩 쉬어서 깊은 갈망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오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막았다.
“수영부터 하자.”
“싫어요.”
“칭얼대도 안 들어줄 건데.”
그가 영아를 번쩍 들어 올려 수영장으로 퐁당 빠졌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태욱에게 매달렸다.
“정말이에요?”
“뭐가?”
그녀는 여우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성이 난 꼬챙이를 둔부로 비볐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거칠게 신음했다.
“나 오빠가 그리워서 깼는데.”
“눈만 뜨면 해야 하는 거야?”
그녀가 발가락으로 귀두 끝을 살살 간질였다. 그는 이를 악문 채 신음을 삼켰다.
“당연하죠. 1년 동안 굶은 거 다 보충해 줘야죠.”
“과식하면 탈 나.”
“음식은 그런데 오빠는 먹을수록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에 관한 한 과식의 기준은 없어요. 무한대니까.”
그녀가 그의 팬티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그녀의 작은 팬티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곧추선 음핵 위에서 꿈틀거렸다.
“좋아, 대신 약속해.”
“하아, 뭐, 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