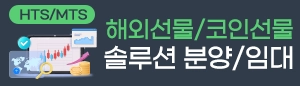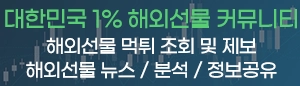비오는 날 공장에서...
 핫썰
경험담
0
2546
0
02.21 18:30
핫썰
경험담
0
2546
0
02.21 18:30
오랜만에 적는 기분인데...
이걸 보면 보면서도 욕할거 같은 기분이네요
이게 말이돼? 어디서 구라를...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졌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도 신기해서
적어봅니다
졸업 후 첫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쉬는 중 알바를 했었다. 내가 일한 곳은 인천에 있는 한 공장이었는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하는 곳이었다. 야간일 때는 나를 포함해 둘 정도 일을 하는데 한명이 펑크를 자주 내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날도 혼자 야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일도 많지 않았고 어렵지도 않아 기계 돌려놓고 있으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렇게 쉬는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어디야?"
"나 일하지. 이번주 야간"
"알바? 인천이지?"
"응. 밖이야?"
"응. 나도 인천이야. 오늘 레슨 잡혀서 늦게 끝났지"
"비오는데 어서 들어가"
"너 있는 데 어디야? 잠깐 보고 갈까?"
"여기? 공장인데 괜찮아? 나도 후줄근한데"
"괜찮아. 커피한잔 하고가지 뭐"
보고싶긴 하지만, 사람도 거의 없는 시간이라고 해도 이 공장에 여자가 온다는 게 부담일 거 같아 주소는 알려주면서도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친구와는 조금 특별하게 관계를 갖게 된 친구인데 기회가 된다면 이 때를 적어보겠다.
밖을 나가보니 빗줄기가 그리 굵진 않았지만 그칠 비도 아니었다. 괜한 기대감과 걱정이 오가며 시간을 보내길 30분 정도 친구에게 도착했다는 연락이 와 나가보니 정말 왔다. 혼자서 칙칙하게 일하는데 여자 하나 왔다고 칙칙한 공장에 기분이 달라졌다. 근데 친구에 비해 후즐근하게 입은 게 좀 창피해서 작업복을 챙겨 입는데도 괜히 냄새나는 거 같고 신경쓰여 조금 떨어져 있었다. 커피를 건네주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 친구가 왜그러냐길래 일하던 중이어서 냄새날까봐 그런다고 했더니 괜찮단다. 일하는 중이었으니까 이해한다고.
비와서 습한데 작업복을 입어서 땀이 금방 올라오던 차에 옷을 벗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공장을 두리번거리다 "여기 cctv는 없지?" 묻길래 대부분 있다고 하니 조금 아쉽단 투로 "에이..." 하길래 아래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얼른 "없는 곳 알아" 라고 말하며 이끌었다. 공장 옆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휴게실처럼 쓰는 곳이었다. 정확히는 다른 업체가 쓰는 사무실 내 휴게실인데 공용 휴게실은 담배와 쓰레기로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절대 갈 수 없었다.
암튼, 그렇게 들어가니 적당히 어둡고 비상구 초록 램프만 켜져 있는데 모텔의 빨간 조명보다도 야릇했다.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에서 살짝 머뭇거리며 소파에 앉아 이끌어 위로 올라탄 형태로 안고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믹스커피의 맛이 느껴지는 타액이 그 어떤 커피보다 감미로웠다. 몸안의 감각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맛이었다. 달콤한 타액과 향수와 섞인 살결에서 나는 향기가 흥분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심장뛰는 박동에 몸이 따라 떠는 느낌이었다.
옷을 벗을 수는 없어서 옷 안에서 후크를 풀어 브라를 벗고 상의에서 팔을 빼 가슴 위로 올려 빨기 시작하니 부르르 떨며 느끼기 시작했다. 치마 안에 입은 속바지를 넘어 나에게까지 속살의 촉촉함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손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영 불편해하니까 일어나 팬티를 벗어버렸다. 일어난 친구를 소파에 앉히고 가랑이 사이로 얼굴을 묻으니 시큼한 건 아니고 섬유유연제와 살냄새와 섞인 은밀한 그 특유의 짙은 냄새가 났다. 아직 촉촉함을 머금은 꽃잎에 입을 맞추자 온몸을 부르르 떨며 토하듯 신음을 뱉어냈다. 내 머리를 미는건지 당기는건지 모르게 내 머리를 움켜쥐며 버둥거렸다.
그렇게 흘러나온 애액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갈 무렵 나도 이젠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소파에 앉아 친구의 다리를 들었고 친구는 그대로 내위에 올라탔다. 위에서 사타구니를 비비며 음모의 까슬함이 느껴졌다. 나는 다리를 들어 허리를 살짝 뺀다음 구멍을 맞춰 바로 살짝 반동을 줘 튕겨넣었다.
"헉! 야 아퍼!! 한번에 그렇게 넣음 아프단말야"
"미안. 못참겠어서"
"니껀 그렇게 넣으면 아파. 읏, 잠깐만.."
아프다고 하면서 친구의 꽃잎은 촉촉함을 지나 액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넣을땐 한번에 넣었지만 살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픈 소리가 아닌 금방 숨차오르는 신음을 내기 시작했다. 잠시 멈췄던 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힘에 부치는지 움직임이 둔해질 때쯤 일어나 뒤로 박기 시작했다. 땀에 젖어오는 귓볼부터 목덜미를 훑으면서 한손으로는 가슴을,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주면서 박으니 움찔거리며 버둥거리는 모습이 정복감을 주었다.
"아학... 나 이상해... 어억..."
"헉헉... 어떤데?"
"아... 몰라... 미치겠어... 아흑..."
"너무 소리내는 거 아냐?"
"아항... 몰라... 비빌때... 까칠해서 미치겠어... 좋아"
장갑끼고 일하면서 까칠해진 손으로 보지를 만지니 자극이 센건지 만지는 대로 흐느끼고 있었다. 아래를 만져주던 손가락을 입에 넣으니 손가락을 빨아대는 모습에 더 미칠것같아 위아래로 더 세게 쑤시면서 가슴에 있던 손으로 더 세게 보지를 비벼주니 온몸을 비틀며 엉덩이를 내밀어 허리 움직임에 맞춰 쫙!쫙!퍽!퍽! 하는 소리가 휴게실 내에 울렸다. 둘 다 이런 공간에서의 섹스가 처음이라 금방 예민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래서 조임이 더욱 세고 자극적이게 느껴졌다.
"아우... 미친... 싸겠다... 으어어... 으으!"
"아으... 야... 안돼... 아아앙!"
"무지 쪼여... 나 진짜 싼다!!"
"아악... 그만... 아악! 꺄악!"
몸 안에서 엄청 조여오는 보지를 한참 예민해진 자지로 느끼며 온몸을 떨며 사정했고, 그 움직임에 예민해진 허리가 들썩이며 보지는 자지를 더욱 조였다. 진짜 이때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거 없이 미쳐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다행히 공장은 잘 가동되고 있었고 시간은 친구가 온 지 두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 좀 더 있다가 비가 그치고 보내주었다. 날이 습해선지 땀을 흘려선지 끈적한 작업복 아래가 애액에 젖어 색이 변해있었고 결국 난 퇴근 전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화장실에서 한번 더 딸을 쳤다.
그립네요 이때가...
지금은 잘 살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