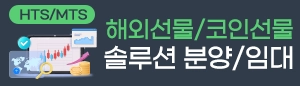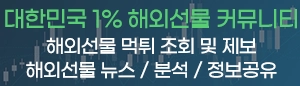오빠의 노예 - 15
 토토군
장편야설
0
901
0
03.29 00:20
토토군
장편야설
0
901
0
03.29 00:20

언제까지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폭탄이 안 터진 채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만약 폭탄이 터지면 그녀를 어떤 식으로 지켜 줘야 할까? 만약 그날이 온다고 해도 죗값은 그 혼자만 치르고 싶었다.
“오빠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웃어 봐요.”
“웃잖아. 네가 자꾸 웃게 하니까.”
사실 영아 곁만 아니면 웃을 일이 없었다. 냉랭한 그의 삶에 영아만이 온기를 전해 줬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유일한 이유였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유일한 존재가 영아였다.
인연이 꼬였지만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싶었다.
안 그러면 평생 이 벅찬 행복감을 느낄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다만 영아한테는 미안했다. 만약 그를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인연을 만났을 텐데. 괜한 그의 욕심 때문에 영아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게 한없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어쩌면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늦어 버렸는지 모른다. 운명이었을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넝쿨처럼 감겨드는 질긴 인연이었다.
아무리 아파도 악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픔보다 기쁨이 더 컸으니까.
“그래요?”
“응?”
“내가 웃겨요?”
또 그런 식으로 가볍게 물으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그는 그녀가 산만해 있을 때 성큼 다가가 얼른 안아 올렸다. 그러고는 그녀가 소리 지를 틈도 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입술을 포개니 그녀의 입술을 절로 열려서 혀를 집어넣으니 바로 두 혀가 얽혀 버렸다.
그만큼 그녀도 흥분해서 혀가 닿기 바쁘게 확 달아올랐다.
언제나 그랬다. 그녀는 마치 그를 위해서 최적화된 여자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전희에 오랜 시간을 들일 겨를도 없이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성적 텔레파시가 잘 통했다.
처음부터 그랬다. 아니, 두 번째였을 것이다. 처음은 그녀에게는 통증을 겨우 참아내느라 힘겨운 시간이었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참아, 참아, 하면서 페니스를 옥죄는 힘이 미칠 것같이 좋아서 자꾸만 밀고 들어갔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서툴기 짝이 없었다. 너무 긴장해서 그녀보다 그가 더 처음 같았다.
물론 처녀를 안아 본 경험이 없기는 했지만 그녀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때를 놓치면 끝일 것같이 절박해졌다.
얼마나 떨었던지.
물론 지금도 떨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정말 실수할까 봐 두려울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처녀지를 그가 처음 뚫고 간다는 의미가 그만의 여자로 만드는 첫 관문이고, 또 그 관문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니 극도로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체위별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우수한 학생이다 못해 미처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까지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영아였다.
“하아, 오빠, 지금이야.”
호흡을 고르기 위해 입술을 떼니 그녀가 몸을 돌려 탁자 모서리에 음순을 비비며 예쁜 엉덩이를 쭉 뺐다.
그는 싱크대 서랍에서 콘돔을 찾아 피임 장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끝냈다.
두 손으로 사과같이 탐스러운 두 엉덩이의 불끈 쥐고는 삽입이 용이하도록 들어 올린 태욱은 구멍 사이로 단번에 페니스를 꽂았다.
“윽!”
“흐흑!”
꽂기만 해도 불꽃이 탁탁 튀면서 감전이라도 된 듯한 전율이 너무 강해서 부르르 몸이 떨렸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질 속에 가만히 페니스를 묻고 있는데 맥박 뛰는 고동 소리와 파닥거리는 나비처럼 날갯짓하는 질 근육의 조임이 리얼하게 느껴졌다.
몸을 한 번 뒤로 빼니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압박 때문에 전해지는 전율이 폭풍처럼 거세졌다.
다시 치고 속살 깊숙이 들어가니 그 사이 첫 번째 오르가슴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아아아…… 으흣!”
영아가 사시나무처럼 떨며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다. 수축과 이완이 수차례 거듭되는 사이 뜨거운 전율이 번개처럼 페니스를 내리쳤다.
다음 순간 피스톤 운동이 리듬을 타고 빨라졌다.
전신이 페니스를 통해 불이 붙어 흥분이 고조되었다.
말초신경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면서 저릿한 통증이 귀두를 통해 요도 구멍까지 타고 흐르자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성기가 마찰하는 소리가 야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엉덩이를 교태를 부리듯 느릿하게 비비자 그는 반대 방향으로 허리를 돌렸다.
“아아아읏!”
폭발할 것 같은 오르가슴이 다시금 그녀에게 찾아왔다.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녀의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몸을 빼서 무릎을 굽혀 혀로 살살 달래 줬다.
두 번으로 오르가슴으로 애액이 줄줄 흐르는 질 속을 혀로 핥아도 핥아도 흘러내려서 입술로 쪽쪽 빨고 혀로 핥고 이로 살짝 물어 주니 흥분이 최고조로 오른 그녀가 속살을 활짝 벌렸다. 황홀하리 만큼 아름다웠다.
“아아…… 오빠!”
“눈부셔.”
그가 경탄하며 다시 페니스를 박아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박차를 가했다.
자궁 깊숙한 곳까지 밀어 넣고 들어 올리고 다시 몸을 빼서 미친 듯이 요동쳤다.
흡사 페니스가 빠질 듯이 죄어오는 질 속 압박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정했다.
“으으흣! 영아야! 좋아, 미치겠다. 하아, 하아윽, 어떻게 이렇게 좋아. 흐윽!”
절정이 너무 강해서 흡사 고문이라도 당한 듯 기진맥진해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단거리 경주라도 한 듯 폐 속에 공기가 다 빠진 것 같았다.
콘돔을 처리하고 난 그가 식탁 위에 그녀를 엎드려 눕혀 놓았다.
우아한 목덜미부터 혀로 핥고 척추를 따라 천천히 핥아 내리자 그녀가 잔잔히 몸을 떨었다.
“우와, 오빠 마법이야. 날 꼼짝 못 하게 하니까.”
“네 몸에 꿀 발랐어? 달달해서 혀를 뗄 수가 없잖아.”
그가 혀를 길게 빼서 엉덩이를 타고 꼬리뼈까지 핥자 그녀가 몸을 비볐다.
“훗, 간지러워.”
“여긴 어때?”
그가 꼬리뼈 밑으로 항문 주름까지 혀를 밀어 넣자 그녀가 훅, 하고 숨을 삼켰다.
“그만해요.”
“괜찮아. 네 건 다 맛있으니까. 힘 빼.”
그녀가 힘을 빼자 활짝 열린 그곳을 샅샅이 핥았다. 눈을 감고 가만히 몸을 맡긴 그녀는 아기처럼 순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음핵과 둔부, 음모, 다리, 발가락까지 씻듯이 핥고 빨고 물어 당겼다.
그리고 몸을 바로 눕힌 그는 귓불부터 목덜미 그리고 유두를 쭉쭉 빨면서 음핵을 천천히 문질렀다.
“하아, 그만해요. 나, 죽겠어. 하읏,”
그러면서 그녀의 다리를 다시 열렸다. 그는 피식 웃으며 중지와 약지로 질 속을 헤집으며 음핵으로 클리토리스 기둥 안쪽을 굴렸다.
“후으하아.”
“좋아?”
“네, 너무 하아, 좋아요.”
예민해져 있는 그녀의 모든 성감대가 그의 손이 닿자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쳤다. 만져 달라고, 빨아 달라고, 물어 달라고.
“넌 온몸이 성감대야. 타고난 요부. 물론 영아는 나를 위한 요부지. 그렇지?”
“하아아, 물론 오빠한테만 예민해요. 아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