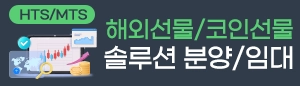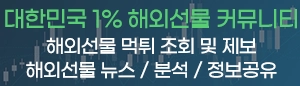오빠의 노예 - 29
 토토군
장편야설
0
854
0
04.02 12:50
토토군
장편야설
0
854
0
04.02 12:50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물어보고 안 먹으면 챙겨 먹으라고 해. 네가 말하면 들을 거니까.”
안 그래도 저렇게 얼굴이 상했는데 연락도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숨은 쉴 여유는 줘야 하니까.
“밥은 먹으라고 하는데 식욕을 잃은 지 오래라서 먹으면 오히려 체해서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래, 원래 소화 기관이 약한데 신경이 예민해지면 더 심하겠지.”
영아는 작고 마른 데다 몸도 약해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아이였다. 그러니 지금 모습을 보니 안 회장이 악인이 된 것 같았다. 그래도 바른길로 이끌기 위해 완고하게 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 그 누가 남매간의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절대 안 될 말이었다.
아무리 의붓남매 간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안 회장에게는 관습이 더 중요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끝끝내 설득해서 입양을 했어야 했는데. 둘 다 내켜 하지 않아서 포기한 게 화근이었다.
지금이라도 영아를 설득해 볼까 했지만 초췌한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천지개벽할 관계라도 상처에 소금을 뿌릴 수는 없었다.
“그만 일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았다.
어렵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인데 요즘은 남보다 더 불편해진 사이가 되고 만 것이 쓰라렸다.
언제쯤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지 그럴 날이 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이렇게 서먹하게 되니 더 힘들었다.
그녀의 잘못도 아닌데 누가 봐도 잘못은 아이들이 했는데 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속상했다.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문제라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도 없는 말을 할수록 더 상처가 되니 관계 개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가족 만남은 다시 가지려고 제안했는데 무뚝뚝한 감사 인사만 받았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샌드위치라도 먹어.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나가기 전에 안 회장은 음식이라도 더 권했다. 하지만 태욱은 샌드위치는 쳐다도 보지 않고 서류를 읽느라 바빴다.
안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바로 나왔다.
서재 문을 닫고 나니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든 아이들한테 따질 수도 없었다.
남편까지 새 드라마 작업 중이라 같이 있지 않으니 더 심란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 문제를 의논할 수도 없지만 말이다.
태욱은 모친이 서재 문을 닫고 나가자 바로 전화했다. 하지만 영아가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몹시 걱정이 되어 벌떡 일어나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30분을 그렇게 시도한 끝에 영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
- 그게 지금 응급실이에요.
“뭐?”
그녀의 목소리에 꺼질 듯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 아점 건너뛰고 저녁을 먹었는데 돌잔치 가서 뷔페 음식 먹은 게 급체를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구역질이 나서 다 게워 냈는데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택시 불러서 응급실 와서 링거 맞는 중이에요.
“왜 그랬어?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그는 그녀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데 아픈 몸으로 응급실에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 훗, 오빠도 잘 안 챙겨 먹으면서. 나만 나무라고 그래.
“난 너처럼 약하지 않잖아. 위도 튼튼하고. 지금껏 한 번도 체한 적 없어서 소화제도 먹은 적 없는데 넌 소화제 달고 살잖아. 그런데 끼니를 거르면 어쩌려고 그래? 응? 내 말 안 들어?”
그는 키를 들고 나가고 있었다. 그때 안 회장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지금 어디 가니?”
“영아가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가봐야겠습니다.”
“뭐? 어디가 아파서?”
안 회장이 깜짝 놀라서 언성을 높였다.
“심하게 체해서 다 게워 내도 아파서 혼자서 응급실을 찾았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혼자서 택시 타고 갔답니다. 비켜 주십시오. 가야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도 아까웠다. 빨리 가야 했다.
- 오빠, 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영아의 기어들어 가는 듯한 목소리는 그를 전혀 안심시켜 주지 못했다.
“괜찮긴. 내가 안 괜찮아. 가서 직접 봐야겠어.”
“같이 가자. 외투 챙겨 올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다. 차고에 뛰어가서 바로 시동을 걸고 총알같이 나와 버렸으니까.
***
영아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 2시쯤 응급실에서 택시 타고 오피스텔로 왔다.
약에 수면제가 들어 있어서 그런지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다.
언제 해가 뜬 거지? 멍한 의식 속에 중요한 사실이 기억났다.
“오빠!”
폰을 확인하고 전화가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어디냐며 집이면 문 열어 달라는 문자도 있었다.
그녀는 얼른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그녀가 버튼을 누르기 바쁘게 바로 지쳐서 잔뜩 갈라진 태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 너 지금 집이야?
“네, 오빠는 어디예요?”
- 오피스텔 앞이야. 문 열어 줘.
마침 공동 현관문 벨이 울리자 꿈에도 그리던 얼굴이 나타났다.
순간 그녀의 코끝이 찡해 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떨리는 손길로 열림 버튼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 중간에서 딱 마주치자 두 사람은 뚫어지게 서로를 살폈다. 그의 야윈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렸다.
“미안해요. 수면제 때문에 잠이 깊게 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많이 기다렸죠?”
“괜찮아. 들어가자.”
태욱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렇게 그에게 이끌려 침대에 누운 영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얼른 손을 뗐다.
“내 손은 지금 너무 차가워.”
영아는 그에게 너무 미안하고 걱정돼서 심장이 욱신거렸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