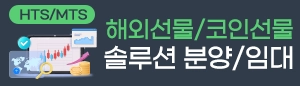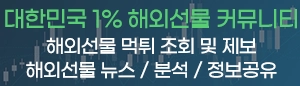오빠의 노예 - 31
 토토군
장편야설
0
1080
0
04.04 00:50
토토군
장편야설
0
1080
0
04.04 00:50

“아냐, 배려해 줘서 고맙긴 한데 아쉽네. 회장님 귀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셔서 있어야 하거든.”
“아, 네. 그럼 씻고 오겠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풀면서 드레스 룸으로 향했다. 그사이 영아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아빠. 그럼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내일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 드릴게요. 괜히 그러신다. 아시잖아요. 원래 소화 기관이 약했잖아요. 네, 최근에 일이 좀 힘들어서 식욕을 잃어서 그래요. 살이야 제가 원래 조금만 적게 먹어도 쑥쑥 빠지는데 잘 찌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밥도 잘 챙겨 먹고 보약도 먹고 있어요. 그럼요.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데요. 괜히 그러신다. 네, 정말요? 좋아요. 네. 네. 그럼 일요일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난 영아가 코끝을 찡긋하며 웃었다.
“아빠 생신에 지리산 별장에서 파티 한대요.”
신이 난 그녀를 보니 태욱의 가슴도 기대감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응, 들었어.”
“언제요? 나한테도 알려 주지 그랬어요.”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네가 아픈 바람에 정신없었잖아.”
그는 아직도 안색이 창백한 영아를 유심히 살폈다.
조직 검사 후 노심초사하는 그를 영아는 새가슴이라고 놀렸다.
그도 그랬으면 싶었다. 단지 그의 지나친 걱정이라고 결과만 나오면 이 숨 막히는 걱정은 안도의 한숨을 바뀔 거라고 말이다.
“단지 급체한 건데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하고 야단이잖아요.”
그때 부인이 다이닝 룸에서 나와서 소리쳤다.
“빨리 씻어. 저녁 다 차렸어.”
“네.”
“오빠 얼른 씻고 오세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영아의 명랑한 태도에 그는 웃고 말았다.
그렇게 그가 씻고 편안한 블랙 트레이닝복으로 입고 다이닝 룸으로 들어오니 마침 영아가 그를 위해 의자를 뺐다.
그가 앉자 영아는 바로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앞에 순두부찌개를 놓고 밥을 퍼준 부인은 영아 앞에 죽을 놓았다.
“난 왜 죽이에요? 죽 싫은데.”
영아가 숟가락으로 죽을 뒤적거리며 투정했다.
사실 영아는 죽처럼 소화가 잘되는 음식은 기피 1호였다.
모친이 먹여 줄 때 인상을 쓰며 마지못해 먹는 모습은 흡사 쓴 약을 먹는 것 같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장님이 죽 말고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하셨어.”
“어머니도 참.”
“그러게 우리 몸은 혹사를 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어. 위가 약할수록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야. 이제 집에 왔으니 방학 동안 잘 챙겨 먹고 튼튼해져야지. 얼마나 부실하게 먹었으면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더 작아져서 아주 반쪽이야. 쯧쯧.”
부인의 앞치마 속에서 폰 벨이 울렸다. 폰을 꺼내 액정화 면을 본 부인이 얼른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그럼요. 네, 아, 네. 지금요? 네, 네.”
전화를 끊은 부인이 말했다.
“회장님 지금 오신다네. 근데 목소리가 안 좋아. 감기라도 걸렸나. 잔뜩 쉬었네.”
모친이 예정보다 일찍 온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았다. 매처럼 날카로운 모친의 살피는 눈길은 몹시 불편했으니까. 그런데 또 목소리가 안 좋다니 몸이 안 좋나 싶어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마음고생 시켜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말이다.
“어구, 퍽퍽 먹어.”
인상을 쓰며 뒤적거리는 영아를 보며 부인이 숟가락을 빼앗아서 입에 넣어 주려고 했다.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어느 천년에. 회장님께서 떠먹여서라도 배를 채워야 한다고 방금 엄명을 내리셨어.”
부인이 아예 영아 옆에 앉아서 명대로 할 기세였다. 영아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죽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지? 내가 끓인 전복죽이지만 정말 맛있다니까. 고소하니. 냄새도 향기롭잖아.”
“뭐, 네. 향기는 좋아요. 비주얼도 좋고.”
부인의 열성에 영아는 마지못해 먹었지만 반쯤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다.
“아니, 왜? 다 먹지 않고.”
“배불러요. 더 못 먹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다이닝 룸으로 모친의 모습이 보였다.
“회장님, 오셨네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며 모친의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모친은 곧장 영아 앞으로 걸어오더니 말없이 딸을 살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영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대하는 모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으응, 그래. 밥은 좀 먹었니?”
모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 그런데 감기 때문이 아니라 울기라도 한 것 같았다.
“밥이 아니라 죽이죠.”
영아의 불평에 부인이 얼른 대꾸했다.
“맛있게 끓인다고 했는데 반은 남겼네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약 챙겨 먹고 좀 쉬어. 태욱아. 나 좀 보자.”
모친의 이런 표정은 언젠가 본 적이 있었다. 그 섬뜩한 예감이 태욱의 호흡도 앗아 갈 정도로 심장을 죄어 왔다.
모친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따라온 태욱은 서재 문을 닫고 숨을 죽인 채 섰다.
“아, 태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