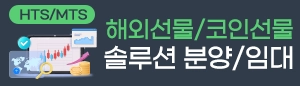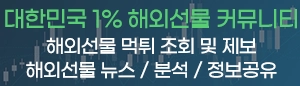(3섬야설) 인도에서 만난 남자 - 20부
 토토군
장편야설
0
556
0
03.18 13:00
토토군
장편야설
0
556
0
03.18 13:00
"쑥~ 대~~ 머리~~~"
"큭큭큭.. 킥킥.. 윽윽.."
아그라포트 성벽에 앉아 케이는 창가를 한 소절 "만" 부른다.
그 유명한 한 소절만.
거기까지는 애교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가락이 내가 아는 흔히 대중매체를 타고 전해졌던 그 가락이 아니다.
***
"케이 그놈 은근히 얄밉지 않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형오 형님이 케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동의를 구한다.
철재 형님과는 이미 교감이 형성된 양 철재 형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여자들은 아침을 먹다 만난 노인이 보여준 향수에 정신이 팔려 자리를 뜰 줄 몰랐고
참을성 없이 먼저 돌아온 우리는 어제의 비밀회동이 있었던 루프탑에 앉아 남자들의 수다를 떤다.
케이는 잠시 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
수컷의 세계는 투쟁의 현장이다.
자신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는 "범부"의 사회다.
군대에 다녀온 후로 몰개성과 전체주의의 패러다임은 쉬이 뛰어난 놈을 뛰어나다고 인정치 못하게 한다.
"난 멋있기만 하던데"
정우의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젖비린내 나는 얘기들의 의견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기각결정.
"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당당하고. 묘하게 매력 있고.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이 부럽던데."
인범 씨의 나름대로 "독특한" 견해다.
개인차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
소수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니까. 어쨌든 기각.
"난 별로 케이에게 불만 없는데요. 가이드로서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
"아저씨들이 그러면 안 됐죠. 케이덕을 그렇게 보고서는. 어젯밤에도, 바라나시에서도."
어이! 자네들까지 그러면 곤란하지. 뒷다마는 같이 까줘야 제맛인데. 상황이 역전되었다.
이들은 단체행동을 개시했다.
덩치 큰 명구와 존재감 없는 재우 마저 반기를 들고 나서자 순간
어느새 우리는 질투에 휩싸인 뒷말하기를 좋아하는 소심하고 한심스러운 중년의 본보기로 둔갑했다.
우리? 아직 난 아니군. 난 아직 어떠한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으니. 뭐 속으로 생각한 것 누가 알겠어?
미묘한 대치 구도에서 슬며시 친 케이파로 발을 옮기려는데 형오 형님과 철재 형이 나를 응시한다.
그들의 눈에는 "너는 어떤 생각이냐"라는 의문부호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다.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냐.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을 것이냐. 고민스러운 순간이다.
"케이. 멋있지. 멋있는 만큼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아닌가?"
제 삼의 길.
영국의 정치가 누가 주창했다던 그 노선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내 나름대로 제 삼의 길"을 걷기로 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도박이다.
잘하면 양쪽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회색 인간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판국이다.
"설마 케이라고 언제나 싱글거릴 수는 있겠어? 화장실에서 일 볼 때나 뭐 절정을 느낄 때라든지 .."
이들에게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재빨리 말을 돌려야 한다.
핀트가 안 맞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 언제나 실실거리는 케이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곰곰이 고민한다.
어이 이 사람들아. 그게 고민씩이나 할 일인가? 대충 웃고 넘기란 말이야. 농담이잖아. 왜 안 웃어? 저질이고만.
속으로 언젠가 보았던 코미디 프로그램 대사를 치러본다.
"케이. 똥 쌀때도 싱글거려요. 노래 부르면서."
계단 밑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은혜의 머리부터 점차로 보이기 시작한다.
생뚱맞게 끼어드는 게 왠지 케이를 닮아간다.
"노래?"
"예. 사이몬 앤 가펑클요. 근데 재밌는 점은요. 케이 못 말리는 음치에요. 코미디에요."
"케이가?"
"기회가 되면 노래 한 번 시켜보세요. 아님. 아침에 저희 방에 살짝 놀러 오시던가요. 케이는 매일 7시에 똥 싸거든요. 아주 케이의 장은 시계에요. 시계."
별로 즐거운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상. 해버렸다. 아침부터. 불길하다. 가끔 이놈의 엉뚱한 상상력은 나의 지배를 받길 거부한다.
"근데 너 왜 왔냐?"
"아 참, 언니들이 빨리 내려오시래요. 아그라포트 가자고."
은혜가 먼저 내려가고 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대충 수습하고 은혜의 뒤를 따른다.
로비를 내러 가자 신문을 읽고 있는 케이가 보인다.
여자들은 케이 주위에서 시끌시끌 수다를 떨고 있고.
"장이 시계라던 케이군 아닌가?"
형오 형이 짓궂게 농을 건다.
"사이몬 앤 가펑클을 좋아한다던 케이 아닌가?"
철재 형님도 못지않게 농을 걸며 인사를 한다.
"네 제가 장이 시계고 사이몬 앤 가펑클을 좋아하는 케이 맞습니다. 두 분 설사는 좀 괜찮으신지요? 쾌차하시지 않으면 빨래하기도 힘드실 건데."
"흠흠. 덕분에"
만만찮은 케이다.
이상하게 인도에 와서 벌써 일주일째 설사를 하고 있다.
물이 안 맞는 건지 음식이 안 맞는 건지.
참다못해 케이에게 상담했더니 가게에서 무슨 가루를 사다 준다. 물에 타 먹으라고.
"정우야~ 이것 봐. 냄새 좋지? 은은한 게. 연꽃향이래. 50루피밖에 안 해."
"누나. 저기.. 저는 무슨 냄샌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맡아봐. 이거 아주 좋아."
"누나. 저 냄새 잘 못 맡는데. 축농증이 있어서."
민경이의 인상이 약간 변한다.
자신이 산 향수가 정우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인지 아니면 축농증이 있다는 정우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민경이는 주위의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마이 페이스다.
쭉 가세요. 당신의 페이스로.
"케이 케이. 나 저거 타보고 싶어요. 봐봐. 말 디게 이쁘다."
말이 끄는 수레, 마차라고 해야 하나?
반항기 처자들은 마차를 보고 케이에게 저것을 타보고 싶다고 조른다.
어차피 자기들 돈 낼 거면서 케이에게 왜 조르나? 거참 이해가 안 가네.
"통가? 흠 이쁘다고 생각하는 동물 학대하는 걸 누님들은 좋아하시나 보네요. 제법 취미가 가학적이신걸요. 뭐 타고 싶으면 타야죠,"
저 마차의 이름이 통가인가 보군.
근데 동물 학대? 원래 저놈들은 생기기를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끌도록 생긴 놈이라고.
"내가 저 말 대신 이 마차를 끌고 싶다. 괜히 미안해지네."
뒷좌석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람한 철재 형님의 심정이다.
내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오. 그냥 걸어갈까?
우리는 통가라는 마차를 여섯 명, 일곱 명으로 두 대로 나누어 터고 아그라포트로 향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마차를 타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으나
곧이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오르막에 낑낑거리며 힘들게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말과 그 말을 채찍으로 때리며 재촉하는 마부의 모습에 케이의 말이 떠올랐다.
"동물을 학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내 참. 길이 이럴 줄 우리가 알았나. 뭐?
****
확실히 알았다. 두 번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나 형님들과 반항기 처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잘 부른다는 사이몬 앤 가펑클 노래 한번 불러 봐"
땀을 손으로 훔치며 땡볕을 돌아다니다 본능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따라 성벽으로 다가간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절로 무릎이 굽혀지고 그렇게 퍼질러 앉아 바람 쐬기를 어언 삼십 분.
바람의 시원함은 어느 정도 만끽했겠다. 슬슬 무료해질 무렵 형님들이 케이에게 노래를 불러보라면 지분거린다.
처음에 거절하던 케이는 자신은 책임을 못 진다며 성벽에 올라앉아 창가를 딱 한 소절만 뽑았다.
놀라웠다." 껌 뱉어"로 스타 반열에 올랐던 음치 패러디 가수 이모 씨는 케이에 비하면 엄청난 음치 교정과정을 거쳤음이 틀림없다.
그래. 당신을 한국 최고 아니 아시아 최고의 음치로 인정합니다~
아. 그러나 형님들은 그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나 보다.
형님들의 성화에 케이는 "표정만" 나직하게 노래를 부른다.
원래 팝송을 즐겨듣지도 않는 데다가 짧은 영어 실력에 가사를 알아들을 리 만무하다.
"그 쾌활한 노래는 뭐냐? 사이몬 가펑클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도 있었냐? 싱글거리는 후렴구는 또 뭐야?"
"The Boxer 요"
"혹시 잔잔하고 애절한 느낌의 그 노래?"
"저도 잔잔하고 애절하게 불렀는데요?"
"그랬구나. 그래었었구나. 미안하다."
드디어 형님들도 인정하고 만족을 한 눈치다.
이제 처자들도 케이에 대한 콩 껍질이 좀 벗겨졌을 테지? 그러면서 여자 일행들을 돌아보니 이 여자들의 눈치가 참 요상하다.
왠지 전보다 더 느끼해진 눈빛들이다.
뭐냐? 동정심과 모성애가 감도는 이 분위기는?
제기랄. 케이녀석.